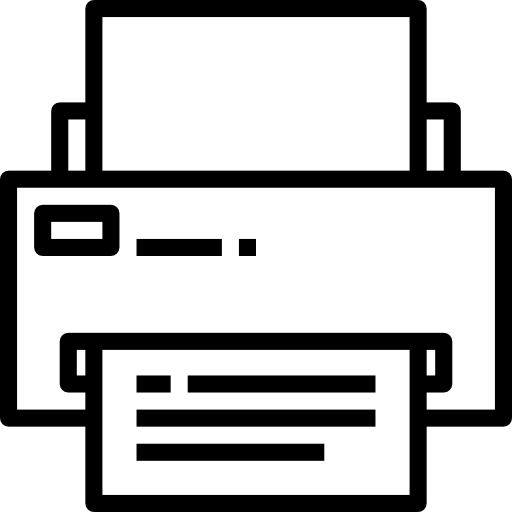국가유산 지식이음
 판독문/해석문
판독문/해석문
-
삼충사사적비 유명조선국충청도청주삼충사사적비명병서 가선대부원임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홍문관제학오위도총부부총관 이덕수(李德壽)가 글을 짓고, 수충갈성결기분무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 행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감춘추관사풍릉부원군 조문명(趙文命)이 글을 쓰고 아울러 전액한다. 우리 임금께서 즉위하신 4년째 무신년(영조 4, 1728년)에 역적 박필현(朴弼顯), 이유익(李有翼)등이 김일경의 흉언을 추종하여 하늘을 속일 수 있다 하고 해와 달을 가릴 수 있다 하고 인심을 의혹시킬 수 있다고 하며 은밀히 서로 선동하고 몰래 반역을 꾀하여 마침내 폐고된 족속인 이인좌(李麟佐), 정희량(鄭希亮)과 결탁하였고 또 이사성(李思晟)과 남태징(南泰徵)이 안팎에서 서로 응하여 그해 3월에 이인좌가 먼저 청주를 함락하였다. 이때 병사 이봉상(李鳳祥)과 영장 남연년(南延年) 및 이공의 막하선비인 홍림(洪霖)이 모두 죽었다. 적은 군사를 나누어 곧바로 서울로 향하였는데 순무사 오명항이 안성에서 적을 패배시키고 또 죽산에서 적을 부수니 적은 마침내 크게 패하고 적괴는 머리를 바치게 되었다. 일이 평정되자 조정에서는 이공에게 좌찬성의 작위와 충민의 시호를, 남공은 병조판서의 작위와 충장의 시호를, 홍군에게는 호조참판의 작위를 추증하였다. 이보다 앞서 적은 장례를 모시는 것으로 위장하여 수레에 병기를 싣고 청주 성안에 들어왔는데 칠흑 같은 밤에 비바람을 타고 고함을 지르며 병영에 다다르니 병영의 비장 양덕보(梁德溥)가 성문을 열어 그들을 맞아들였다. 적은 이공을 붙잡아 위협하며 항복하라고 하니 공은 꾸짖으며 “나는 충무공의 후손이다. 어찌 너희를 좇아 반역하겠느냐?”라고 하니 마침내 해를 당하였다. 또 남공을 항복시키려고 하니 남공도 역시 분연히 꾸짖으며 “내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박았는데 어찌 너희 개자식들에게 항복하겠느냐?”라고 하였다. 이에 칼날이 내리치는데도 꾸짖는 소리를 멈추지 않더니 꾸짖는 소리와 기운이 모두 다 하였다. 홍군은 유약한 사람인데 또한 외부에 있다가 변란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문이 닫혀있어서 벽을 허물고 병영 뜰에 들어가니 창칼이 번쩍이며 매우 급하게 병사를 찾고 있었다. 군은 바로 무리들에게 “내가 병사다.”라고 외치고는 즉시 잡혔으나 알아보는 자가 있어서 “병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니 적이 버려두었다. 이공을 잡고 죽이려고 하자 군은 또 몸으로 그 위에 엎드려 가리니 적이 의롭게 여기며 끌어냈다. 군은 즉각 적을 발로 차고 칼을 뺏어서 여러 명을 해치니 적이 노하여 결박하고는 칼을 들이대며 항복하라고 꾀었으나 끝내 동요하지 않았다. 모여서 보고 있던 적들이 모두 칭찬하며 “충신이로다. 죽이지 않을 수 없지만 너의 후손을 등용하겠다.”라고 하니 군은 꾸짖으며 “나는 아들도 없거니와 있더라도 어찌 역적에게 등용되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마침내 죽었다. 아아! 이공과 남공의 죽음은 진실로 장렬하지만 직책을 가지고 죽은 것이요,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이다. 홍군 같은 경우는 관리로서의 직책도 없고 임금의 녹봉도 없이 다만 일개 편비(褊裨)로 강개하여 의리에 순절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더욱 장렬하지 않겠는가? 무릇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것은 충신과 난적이 애당초 어찌 같지 않았겠는가? 한 가지 생각이 갈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충신과 역적의 구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역적이 비록 한때는 사납게 날뛰더라도 문득 이분들이 죽음으로 절개를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되니 사람의 도리가 끝내는 끊어지지 않고 하늘의 도리가 끝내는 어지럽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이 분들을 능히 사납게 죽일 수 있었지만 그 흉봉과 잔학한 흉염도 역시 그에 따라 모르는 사이에 그쳐 없어져 안성과 죽산에서의 패배를 기다릴 것도 없이 그 기운이 정녕 이미 먼저 죽어버린 것이 이와 같으니 난리를 평정한 공로가 이 몇 분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목사 조준명(趙駿命)이 난리를 치른 후에 임무를 받아 이 분들이 의리로서 돌아가신 곳을 찾아서 여러모로 살펴보고는 탄식하며 또 고을의 나이든 사람들에게 두루 물어보고 이 분들이 의리로 목숨을 바친 전말을 매우 상세하게 얻어 듣고는 백성의 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곳에 있으며 간사한 역적의 싹을 꺽는 것이 이곳에 있다고 이르며 성중에 삼충사(三忠祠)를 건립하여 이공과 남공을 모시고 홍군을 배향하니 고을 사람 박지후(朴之垕)와 위장 최태경(崔泰敬)등이 분주하게 노력하여 며칠이 되지 않아 사당이 완성되었다. 이에 이곳 고을의 백성과 선비들이 모두 감격하고 분발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마치 이 분들이 순절하던 당시와 같았고 또한 기뻐서 날뛰는 것은 마치 이 분들이 다시 살아난 듯이 하였으니 하늘의 이치가 사람마음에 있음을 속일 수 있겠는가? 천총(千摠) 김규(金珪)와 장교 김지행(金志行), 임만규(林萬揆)등이 또한 비석세우는 일을 준비하고 목사 조공의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달려와 나에게 글을 청해 영구히 전한다. 지행(志行)은 일찍이 이공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다. 명(銘)하노니, 때는 무신년, 도적이 있어 남쪽에서 일어나니 우리가 방비하지 못한 것을 틈타 우리 원수를 죽였네. 원수는 이 누구인가? 충무공의 후손이라네. 가문의 명성을 능히 이어 의로운 이름 오래도록 간직하였네. 장렬한 남공(南公)은 혀를 내둘러 적을 꾸짖으니 몸은 비록 처형되었으나 그 기색 의연하였네. 빼어난 홍림(洪霖)은 굴복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처음에 병사를 대신해서 죽기를 바라고 끝내는 큰칼을 휘둘렀구나. 바람소리 거세고 날은 어두운데 하늘도 근심하고 귀신도 우는구나. 저 완악한 무리가 어찌 알았으랴. 또한 혀를 차고 탄식하는구나. 세 분의 절개 환연히 빛나서 일월과 같이 높이 걸렸으니 인간의 윤리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도리도 힘입었구나. 적들의 기세는 안에서 사그러 들으니 적군의 궤멸을 기다릴 것도 없이 소탕하고 평정한 공적은 이곳에서 시작되었구나. 새로 지은 사당 장엄하고 웅장한데 동서에 신위를 모시니 그 누가 계획하였는가? 목사 조공이 능히 하였구나. 목사가 처음 계획하고 온 백성이 함께 부응하여 완공한 뒤에 제사 올리니 풍성한 제물과 향기로운 술 있구나. 바람타고 안개타고 영혼이 오셨으니 천년이후에도 폐지되지 않으리. 충성이 아니면 어찌 권하며 의리가 아니면 어찌 배우랴? 사당 앞에 비석 있으니 지나가는 이들은 공경할지어다. 숭정기원후 두 번째 신해년(영조 7, 1731년) 9월 일에 세움 뒷면 본도의 어사 오원(吳瑗)이 글을 올려 사우의 현판을 내려주기를 청하였고 전 시직(侍直) 조구명(趙龜命)이 상량문을 지었으며 전 자의(諮議) 채지홍(蔡之洪)이 봉안하는 제문을 지었다. 사우를 건축하는 일에 부조한 사람의 목록 병조판서 김동필(金東弼), 훈련대장 장붕익(張鵬翼), 어영대장 어유구(魚有龜), 총융대장 조빈(趙儐), 본도감사 신방(申昉), 본도병사 김중려(金重呂), 본도병사 어유기(魚有琦), 본도수사 윤택정(尹宅鼎), 경상감사 조현명(趙顯命), 통제사 이수량(李遂良), 통제사 정수송(鄭壽松), 전라좌수사 이중신(李重新), 평안병사 김흡(金潝) 물력이나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을 함께 초록하였고 도내(道內)의 여러 고을과 진영이 모두 부조가 있었으나 번거로워서 다 기록하지 않는다. 이충민공의 아들인 수사 한필(漢弼)도 또한 본주(本州)의 농토 4결을 납부하였다. 조준명(趙駿命)이 기록함. 비석을 세우는 일에 부조한 사람의 목록 병사 어유기, 목사 조준명, 병영(兵營) 집사청(執事廳) · 대변청(待變廳) · 장관청(將官廳) · 작대청(作隊廳), 중영(中營) 장관청 · 집사청 · 군관청, 산성(山城) 수첩청(守堞廳) · 재가청(在家廳), 본주 향청, 공주진 장교청, 충주진 장교청, 홍주진 장교청, 해미진 장교청, 순천영 장교청. 비색리(碑色吏) 한세걸(韓世傑), 고자(庫子) 최효완(崔孝完), 차사(差使) 한후강(韓厚岡), 석수(石手) 서세량(徐世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