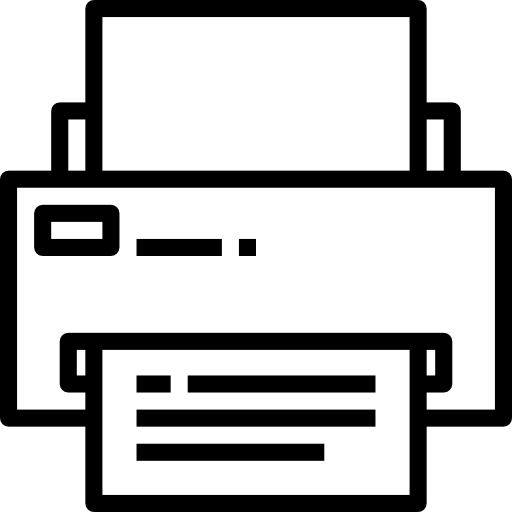국가유산 지식이음
 판독문/해석문
판독문/해석문
-
고려국(高麗國) 강릉도(江陵道)1 존무사(存撫使)2 천호(天皓)와 지강릉부사(知江陵府事) 박홍수(朴洪秀), 판관(判官)3 김광보(金光寶), 양주(襄州)4부사(副使)5 박전(朴琠), 등주(登州)6 부사 정연(鄭椽), 통주(通州)7부사 김용경(金用卿), 흡곡(歙谷)8현령(縣令)9 ▨▨신(▨▨臣), 간성(杆城)10현령 착유(辶裕), 삼척현위(三陟縣尉)11 조신계(趙臣桂), 울진현령(蔚珎縣令) ▨▨, ▨▨감무(▨▨監務) 박▨(朴▨) 등이 선(善)을 좋아하는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들[尊卑]과 더불어 발원(發願)하여 삼가 향목(香木) 1500조(條)를 각 포(浦)에 묻고, 뒤에 그 수를 나열합니다. 용화회주(龍華會主) 미륵(彌勒)12이 하생(下生)13하기를 기다리고, 삼보(三寶)14를 공양(供養)하지 못한 자를 만나 함께 태어나기를 발원합니다. 이 해는 원나라 지대(至大)15 2년 기유년(己酉年 : 충선왕 1, 1309) 8월 일에 만듭니다. [비음(碑陰)] 묻은 숫자[開數] 평해군(平海郡) 땅 해안사(海岸寺) 동구(洞口)에 100조를 묻다. 삼척현(三陟縣) 땅 맹방촌정(孟方村汀)에 150조를 묻다. 울진현(蔚珎縣) 땅 두정(豆汀)에 200조를 묻다. 양주(襄州) 땅 덕망산(德望山)에 100조를 묻다. 강릉(江陵) 땅 정동촌정(正東村正)에 310조를 묻다. 동산현(洞山縣)16 땅 문사정(文泗汀)에 200조를 묻다. 간성현(杆城縣) 땅 공▨▨(公▨▨)에 110조를 묻다. 흡곡현(歙谷縣) 땅 구말을(摳末乙)에 210조를 묻다. 압융현(押戎縣)17 학포(&A2177;浦)에 120조를 묻다 [우변(右邊)] 황제(皇帝 : 원나라 武宗)의 만수무강과 국왕(國王 : 충선왕)-궁주(宮主)-의 복(福)과 수명(壽命)이 오래되기를 바랍니다. 미륵전(彌勒前) 장정보(長灯寶)에 ▨은(▨銀) 1근을 거두어 고성두목(高城頭目)이 관할합니다. 이 해는 기유년 8월 일 [좌변(左邊)] 미륵▨▨▨▨보(彌勒▨▨▨▨寶) 통주부사 김용경이 시주하였습니다. 양주부사 박전이 시주하였습니다. 양원(壤原) 대하평(代下坪)에 있는 답(畓) 2결(結)을 바칩니다. (동북쪽[東北]은 농사짓지 않는 진답(陳畓)18이고, 큰 제방[大冬音]19이 있습니다. 남쪽은 길이 있습니다. 서쪽은 백정(白丁) 우달(于達)의 경작지입니다.) 북사이(北史伊)에 있는 답 2결을 바칩니다.(서쪽은 미륵사(彌勒寺)의 답이고, 동북쪽은 주군(州軍)의 진답(陳畓)입니다. 남쪽으로 군(軍)이 있습니다.) 같은 곳의 전(田) 2결을 바칩니다.(동남쪽은 제방[吐]20이고, 서쪽은 진지(陳地 : 농사짓지 않는 땅)이며, 북쪽으로는 종이천(鍾伊川)21에 이릅니다.)
강릉(江陵)은 지금의 강원도 강릉(江陵) 지역이다. 강릉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의 강원도 북부와 함경남도 남부 지역 일대에 걸쳐서 도(道)가 설치되었다. 이 삼일포 매향비와 관련하여 언급된 지역은 1330년에 강릉도존무사로 부임한 안보의 순행 지역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모두 강릉도 관할이었던 것 같다(채웅석, 2002, 「여말선초 향촌사회의 변화와 매향 활동」『역사학보』173). ↩
고려후기에 도(道)에 파견한 외관(外官)의 하나. 공민왕(恭愍王) 5년(1356) 6월의 기록에 따르면, 존무(存撫)·안렴(按廉)·주현관(州縣官)은 분우(分憂)하여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설명하였다(『高麗史』 75 選擧志 3 銓注 選用監事). 보통 충선왕 때에 안렴사(按廉使)가 제찰사(提察使)로 바뀌고 강릉도(江陵道)와 평양도(平壤道)에 존무사가 설치되어 5도제찰(道制札)·2도존무사제(道存撫使制)로 변하였으며, 공민왕 5년에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가 회복되면서 남쪽의 강릉도가 안렴사도(按廉使道)로 바뀌고 양계에는 도순문사(都巡問使)가 파견되었다고 이해하지만(邊太燮, 1971,「高麗按察使考」『高麗政治制度史硏究』, 一潮閣), 안정도존무사(安定道存撫使), 서북면존무사(西北面存撫使), 동북면존무사(東北面存撫使), 탐라존무사(耽羅存撫使) 등의 명칭도 보이고 있다. ↩
지방행정에서 수령을 보좌하며, 군현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간의 업무를 원활하게 조절하면서 수령에게 보고하는 군현의 직책(職責)이다. 도호부(都護府) 이상의 판관(判官)은 6품 이상, 방어군(防禦郡)·지주군(知州郡)의 판관은 7품이었다. 예종(睿宗) 11년(1116)에 경(京)의 판관을 소윤(少尹)으로, 이하 나머지 판관은 통판(通判)으로 개칭하였다(朴宗基, 1997,「고려시대의 지방관원들―속관(屬官)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24). ↩
현재의 강원도 양양 일대이다. ↩
고려시대 주(州)와 군(郡)에 설치된 지방관으로, 6품 이상이 임명되었다(『高麗史』 77 百官志 2 知州郡). ↩
지금의 함경남도 안변 지역이다. ↩
지금의 강원도 통천군 지역이다. ↩
지금의 강원도 통천군 전답면 지역이다. ↩
현(縣)의 지방관(地方官)으로, 현에 7품 이상의 1인이 령(令)으로 두어졌다(『高麗史』 77 百官志 2 諸縣). ↩
지금의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일대이다. ↩
현(縣)의 지방관(地方官)으로, 현(縣)에 8품의 1인이 위(尉)로 두어졌다(『高麗史』 77 百官志 2 諸縣). ↩
산스크트리어인 Maitreya의 음역(音譯)으로 석존(釋尊)의 교화(敎化)를 받고 미래에 성불(成佛)하리라는 수기를 받아 도솔천에 올라가 있으면서 하늘에서 천인(天人)들을 교화하고 석존의 입멸(入滅) 후 56억7천만년 후에 다시 사바세계에 출현, 용화수 아래에서 성도(成道)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救濟)한다고 한다. ↩
미륵은 56억 7천만년 동안 도솔천(兜率川)에서 수양하다가 남섬부주(南贍部洲)로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세 번 설법하여 중생을 구제한다고 한다. 여기서 하생(下生)은 미륵의 이러한 행동을 뜻한다. ↩
불교에서 보물로 여기는 세 가지. 즉 부처[佛]·불경[法]·승려[僧]를 가리킴. ↩
원(元) 무종(武宗)의 연호(年號)로 1308~1311년 사이에 사용되었다. ↩
지금의 강원고 양양군 현북면 지역이다. ↩
현재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등전양책(藤田亮策)은 함경남도 안변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藤田亮策, 1963, 「三一浦の埋香碑」『朝鮮學論考』). ↩
농사를 짓지 않는 진전(陳田)을 의미한다(藤田亮策, 1963, 「三一浦の埋香碑」『朝鮮學論考』). ↩
『磻溪隧錄』에 언급된 대제(大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藤田亮策, 1963, 「三一浦の埋香碑」『朝鮮學論考』). ↩
이두로서 ‘밧’으로 읽히며 역시 ‘제(堤)’, ‘제(隄)’를 의미한다(藤田亮策, 1963, 「三一浦の埋香碑」『朝鮮學論考』). ↩
허흥식은 ‘종(鍾)’으로 끝났으나, 황수영은 ‘종이천(鍾伊川)’으로 판독하였다(황수영, 1976, 『한국금석유문』, 일지사). ↩